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식
All Nobel Prizes. Literature prize 2024
2024. 12. 10 스웨덴 스톡홀름 컨벤션홀
스웨덴 화학자 알프레드 노벨(Alfred Bernhard Nobel 1933-1896)이 기부한 다이너마이트 발명 기금 3,100만 크로나로 노벨재단이 설립된 후 1901년부터 매년 인류의 복지에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수여된다
노벨상은
ㅇ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의학), 경제학상은 스웨덴 왕립과학아카데미,
ㅇ 문학상은 스웨덴. 프랑스. 에스파냐의 세 아카데미
ㅇ 평화상은 노르웨이 국회가 선출한 5인 위원회에서 수상자를 심사 결정한다.
경제학상은 1969년 추가되었다 스웨덴 노벨위원회에서 5개 부문상을 선정하고 평화상은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수상 대상은 생존해 있는 사람이어야하고 수상후에는 사망해도 자격이 유지된다
ㅇ 시상식은 매년 12월 10일 노벨이 사망한 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다
ㅇ 시상금은 1,100만 크로나(약 13억원)상금과 금메달 그리고 상장이 주어진다
노벨상은 1988년 프랑스 한 신문에
'죽음을 팔아 돈을 번 거부 알프레드 노벨 사망하다' 라는 오보를 냈다
이는 알프레드의 형 루드비히 노벨의 죽음을 잘못 기사화 한 오보였다
자신의 부고 기사를 접한 알프레드 노벨은 자신이 죽은 후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지 깊은 고심에 빠졌다
즉 자신은 다니너 마이트를 발명해 막대한 부를 쌓았으나 그 다이너 마이트는 전쟁에서 수 많은 인명을 살상한 화약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7년후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장에 '내 재산을 성별 국적에 상관없이 물리학, 화학, 의학, 문학, 평화 분야에서 인류 공헌에 이바지한 사람들에게 수여한다' 라는 내용을 적었다 그로부터 1901년부터 노벨재단이 설립되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수학분야에 시상이 없는 것은 노벨이 수학자와 연적 관계, 당시 유명한 수학자 미타그 레플러와 앙숙관계였기 때문이라는 추축이 돌고 있다
한국의 노벨상 수상자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
2024년 한강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
. . . 그런데 노벨 위원회 기록에 의하면 또 한 명의 수상자가 기록되어 있다
그는 1987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데 찰스 피터슨이다 노르웨이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를 둔 피터슨은 해양 엔지니어였던 그의 아버지가 당시 부산 세관에서 일하고 있던 관계로 1904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피터슨은 '크라운 에테르'라는 유기 화합물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 수상자 출생지로 분류했을 때 한국에 집계된 것이다
한강 작가 문학 작품
ㅇ 시집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
ㅇ 소설
- 소설이 온다 (광주5.18민주화)
- 채식주의자
- 작별하지 않는다(제주4.3 사건)
- 희랍어 시간
- 여수의 시간
- 내 여자의 열매
- 회복하는 인간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 위해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날아간 시기에 한국에서는 윤석열 쿠데타가 일어 났다
작품 '소설이 온다' 1980년 광주 상황을 실시간으로 맞추기 위한 현실을 만들어 주는 것 같은 착각이 들게 한다
차라리 윤석열이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의 현장을 실감나게 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쿠데타 현장을 조성했다고 한다면 귀엽기라도 할 것이다
헬기로 무장 군인을 국회에 침투시켜 국회의원을 감금하여 국가 불안을 조성하고 독재 상황으로 만들어 국민을 억합하려는 45년전 시대 역전으로 만들려는 역사 반전의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만들었다
온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K-문화가 온 세상을 휘덥고 있는 한국에서 정상적 사고로는 이해하기 힘든 시대 착오적인 편착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것도 대통령이라는 부끄러운 국가 원수에 의해 저질러진 창피함이다
차라리 한국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기념하여 개그 한편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한 바탕 웃고 넘어갈 것이다
평화의 제전 노벨상 시상식에서 한국의 얼굴에 구정물을 뒤집어 씌운 얼마나 큰 창피함인가
한강 작가 시집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에서 ( 2024. 10. 29 아리산방 시담 자료)
1. 어느 늦은 저녁 나는 (한강)
어느
늦은 저녁 나는
흰 공기에 담긴 밥에서
감이 피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때 알았다
무엇인가 영원히 지나가버렸다고
지금도 영원히
지나가버리고 있다고
밥을 먹어야지
나는 밥을 먹었다
2. 새벽에 들은 노래 3 (한강)
나는 지금
피지 않아도 좋은 꽃봉오리거나
이미 꽃잎 진
꽃대궁
이렇게 한 계절 흘러가도 좋다
누군가는
목을 매달았다 하고
누군가는
제 이름을 잊었다 한다
그렇게 한 계절 흘러가도 좋다
새벽은
푸르고
희끗한 나무들은
속까지 얼진 않았다
고개를 들고 나는
찬 불덩이 같은 해가
하늘을 다 긋고 지나갈 때까지
두 눈ㅂㄴ이 채 씻기지 않았다
다시
견디기 힘든
달이 뜬다
다시
아문 데가
벌어진다
이렇게 한 계절
더 피 흘려도 좋다
3. 파란 들 (한강)
십 년 전 꿈에 본
파란 돌
아직 그 냇물 아래 있을까
난 죽어 있었는데
죽어서 봄날의 냇가를 걷고 있었는데
아, 죽어서 좋았는데
환했는데 솜털처럼
가벼웠는데
투명한 물결 아래
희고 둥근
조약돌들 보았지
해맑아라
하나, 둘, 셋
거기 있었네
파르스름해 더 고요하던
그 돌
나도 모르게 팔 뻗어 줍고 싶었지
그때 알았네
그러려면 다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때 처음 아팠네
글러려면 다시 살아야 한다는 것
난 눈을 떴고
깊은 밤이었고
꿈에 흘린 눈물이 아직 따뜻했네
십년 전 꿈에 본 파란 돌
그 동안 주운 적 있을까
놓친 적도 있을까
영영 잃은 적도 있을까
새벽이면 선잠 속에 스며들던 것
그 푸른 그림자였을까
십 년 전 꿈에 본
파란 돌
그 빛나는 내(川)로
돌아가 들여다보면
아직 거기
눈동자처럼 고요할까
4. 효에게. 2002. 겨울(한 강)
바다가 나한테 오지 않았어
겁먹은 얼굴로
아이가 말했다
밀려오길래. 먼 데서부터
우리 몸을 지나 계속
차오르기만 할 줄 알았나 보다
바다가 너한테 오지 않았니
하지만 다시 밀려들기 시작할 땐
다시 끝없을 것처럼 느껴지겠지
내 다리를 끌어안고 뒤로 숨겠지
마치 내가
그 어떤 것
바다로부터조차 널
지켜줄 수 있는 것처럼
기침이 깊어
먹은 것을 토해내며
눈물을 흘리며
엄마. 엄마를 부르던 것처럼
마치 나에게
그걸 멈춰줄 림이 있는 듯이
하지만 곧
너도 알게 되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억하는 일뿐이란 걸
저 번쩍이는거대한 흐름과
시간과
成長.
집요하게 사라지고
새로 태어나는 것들 앞에
우리가 함께 있었다는 걸
색색의 알 같은 순간들을
함께 품었던 시절의 은밀함을
처음부터 모래로 지은
이 몸에 새겨두는 일뿐이란 걸
괜찮아
아직 바다는 오지 않았으니까
우리를 쓸어 가지 전까지
우린 이렇게 나란히 서 있을 테니까
흰 돌과 조개껍데게를 더 주울 테니까
파도에 젖은 신발을 말릴 테니까
까글거리는 모래를 털며
때로는
주저앉아 더러운 손으로
눈을 훔치기도 하며
5. 거울 저편의 겨울 12(한강)
-여름 천변. 서울
저녁에
우는 새를 보았어.
어스름에 젖은 나무 밴치에서 울고 있더군
가까이 다다가도 달아나지 않아서
손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어도
날아가지 않아서
내가 허깨비가 되었을까
문득 생각했어
무엇도 해칠 수 없는 혼령
같은 게 마침내 된 걸까, 하고
글래서 말해 보았지 저녁에
우는 새에게
스물네 시간을 느슨히 접어
돌아온 나의
비밀을.(차갑게)
피 흘리는 정적을, 얼음이
덜 녹은 목구멍으로
내 눈을 보지 않고 우는 새에게
-거울 저편의 겨울 연작시 1~12편 중 마지막 편
제목 밑에 부제목 여름 천변. 서울.
소년이 온다 p126 (한강 장편소설)
그후 우리는 이따금 만나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서로가 자격증 시험에 떨어지고 교통사고를 내고 , 빚이 생기고 , 다치거나 병을 얻고, 정 많고 서글서글한 여자를 만나 잠시 모든 고통이 끝났다고 믿고, 그러나 자신의 손으로 모든 걸 무너뜨려 다시 혼자가 되는 비슷한 경로를 거울 속 일그러진 얼굴처럼 지켜보는 사이 십년이 흘렀습니다. 하루하루의 불면과 악몽, 하루하루의 진통제와 수면유도제 속에서 우리는 더이상 젊지 않았습니다. 더이상 누구도 우리를 위해 염려하거나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조차 우리를 경멸했습니다. 우리들의 몸속에 그 여름의 조사실이 있었습니다. 검정색 모나미 볼펜이 있었습니다. 하얗게 드러난 손가락뼈가 있었습니다. 흐느끼며 애원하고 구걸하는 낯익은 음성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김진수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꼭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 형
아직 완전히 취하지 않은 그의 검고 깊은 눈이 나를 응시했습니다
언제가 됐든 내가 죽을 땐, 그 사람들까지 꼭 데리고 갈 생각이었어 잠자코 나는 그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아, 지쳤어.
형, 하고 그는 다시 나를 불렀습니다. 맑은 술이 담긴 유리잔을 내려다 보며 마치 내가 그속에 있어 말을 거는 것처럼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총을 들었지, 그렇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그에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를 지켜줄 줄 알았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일에 익숙한 듯, 그는 술잔을 향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걸 쏘지도 못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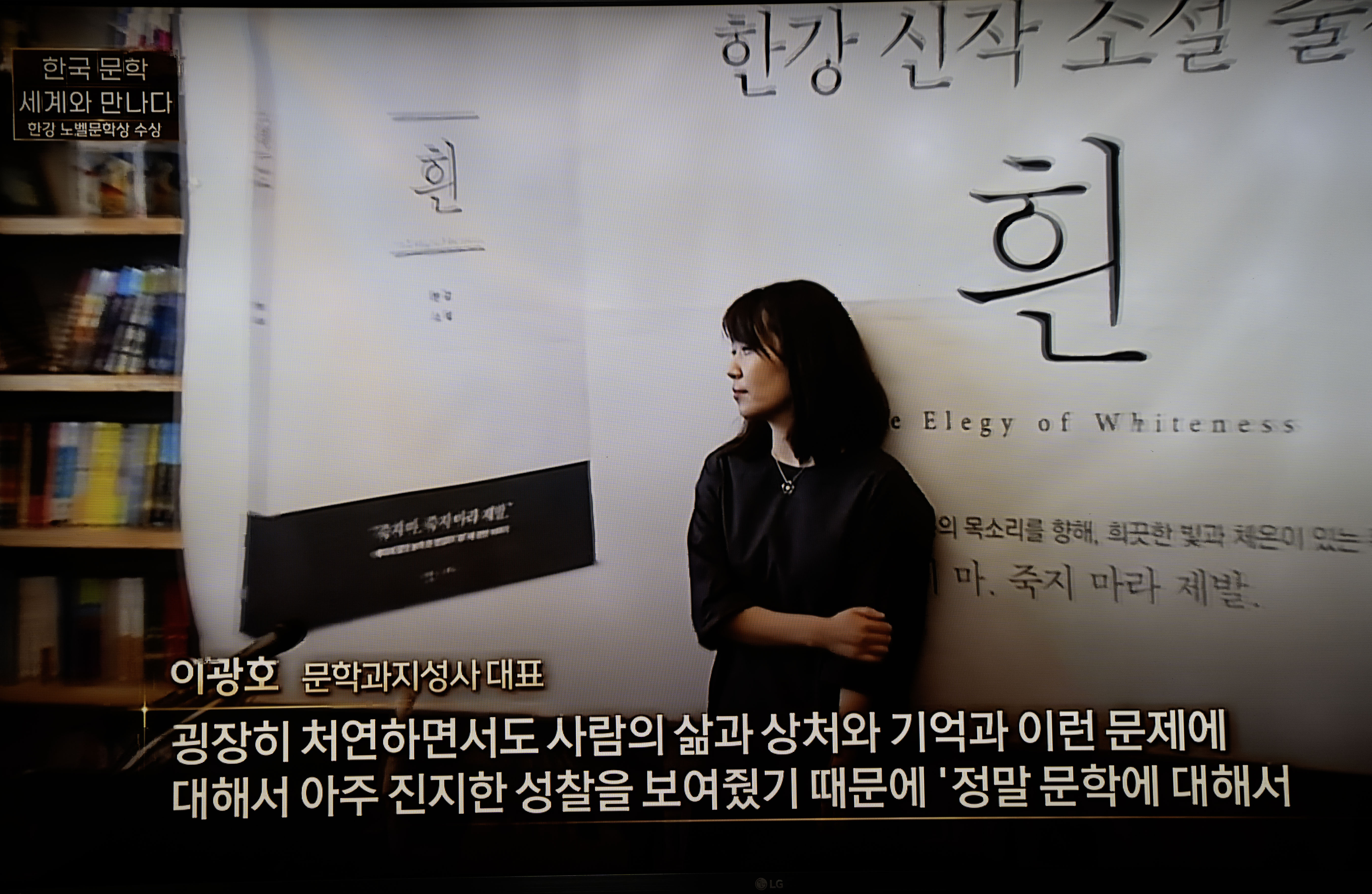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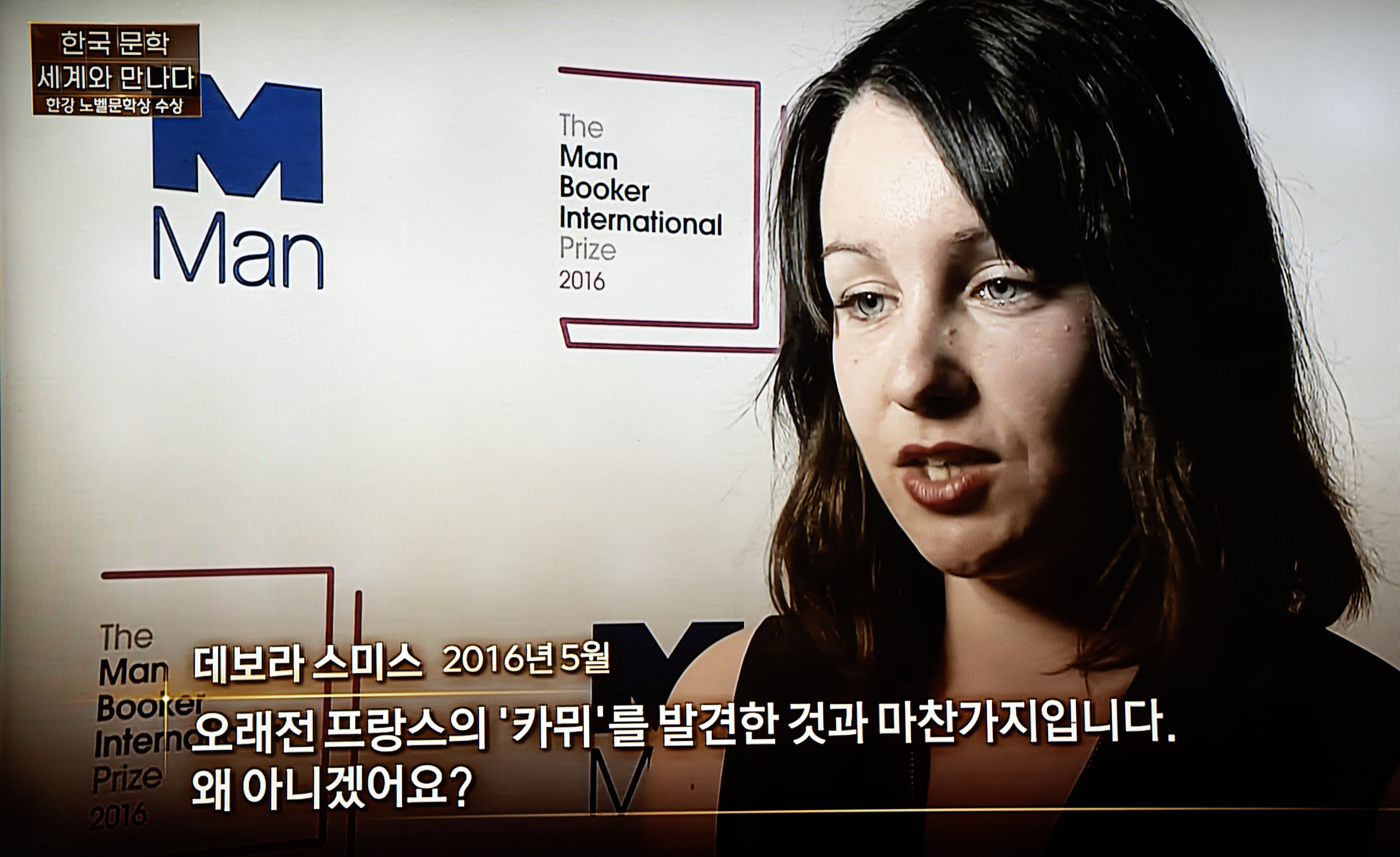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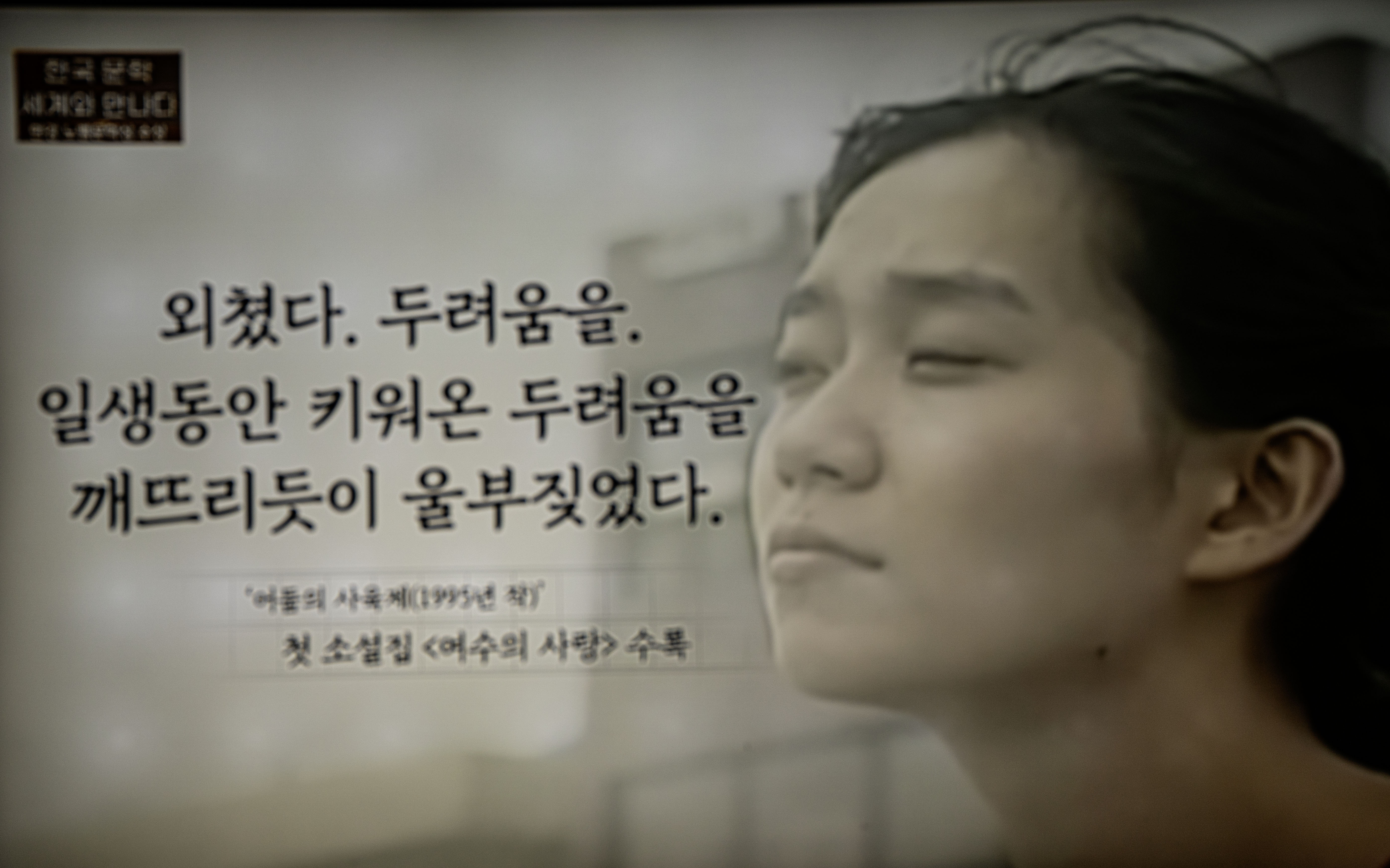
'문학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창덕궁 전래석 」 지하철 시 대림역 아리산방 시담 (78) | 2024.12.24 |
|---|---|
| 한강 강연 노벨문학상 수상 스웨덴 한림원 (58) | 2024.12.20 |
| 지하철 시 제목 '창덕궁 전래석' 박영대 지하철 역 게시 (55) | 2024.11.26 |
| 지하철 시 선정작 「창덕궁 전래석 」 (40) | 2024.11.18 |
| 시심방 출판 기념 김훈동 시인 산수연 (28) | 2024.11.16 |